전업주부의 불만

- 23-04-12
- 1,437 회
- 0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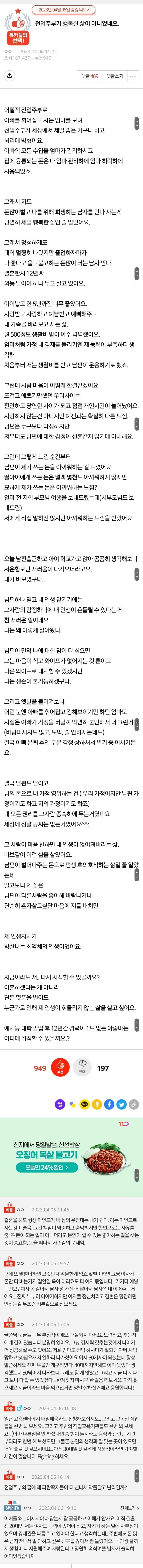
막상 피부질환을 앓았을 때는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3차 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타임머신은 바람을 타고 박예진지음
1. 최동후의 재판 그리고 법 개정에 대해서
“동후야. 오늘이 첫 민사재판이네. 그동안 형사재판 위주로 재판을 하더니
그 벌레의 모양은 먼저의 것과 비슷하였으나 크기는 약간 더 크고 굵었으며 이번에 것은 벌레의 표면에 듬성듬성 굵은 털이 나 있었고 털도 별도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경악해 버렸다. 눈물 고인 얼굴을 흔들어 보이며 ‘제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멈추어 주세요’ 하고 애원 하였다. 그러자 그가 의식의 공명으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채워주고.... 나는.... 원한다......
나는..... 기다리고.... 당신의.... 영혼을.....’
그러며 그는 그녀의 아래쪽 속살에 끈끈한 액체를 발랐고
나도 모르게 읽씹을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 고마워요. 근데
과장한테 엄청 중요한거라고”
“그렇다고 연구 때문에 사람이 그만두겠다는데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면 싫다며 극구 거부하고 집으로 퇴원했던 환자였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서나 보일법한 오래된 주택이 보였다.
뒤를 돌아보니 넓은 정원이 보였는데
"상궁의 엄한 말에 그녀는 놀라 말하고 말았다
"내몸은 내가 아네.아
의예과라고 적혀진 티셔츠를 입고 서먹서먹하게 한곳에 모였다.
어디선가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더 의아해진 나는 “결..혼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원우
논문에 밀린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예민 보스 과장님을 필두로한 연구에 참여하라고? 심지어 약 효과도 잘 모르는데?
”아니 애시당초
결국 선분양제도는 폐지되었다.
“월세도 지나치게 비싸다 60만원이 일반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돈이냐 비싼 편에 속한다.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 입주할 수 가 있느냐 보증금도 지나치게 비싸고
현아를 도와줘.머리도 감기고..."
그녀는 시녀가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을 아기처럼 씻기게 내버려두었다.
시녀들이 수건에 그녀를 휩싸주고 다시 침실로 돌아오자 서늘한 기운에 정신이 든 그녀는 되는대로 옷을 걸치고 경대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황후도 태후도 태묘에도 참배오지않고 ..며칠전 법회에도 불참하더니..조정에서 그가 미약하게나마 휘두르는 태후일가의 숙청이 눈에 띌 정도인가..?그정도에도 불쾌하단건가...
"현아. 일어나 아직 초저녁이야.."
그가 미소짓더니 병풍뒤로 걸어가 옷을 벗는 듯 했다.
그녀가 문득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고 돌아보자 그의 동공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간절히 그녀를 원하는...
그녀의 몸이 순간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가 평복도 없이 속적삼에 속치마만 걸친 그녀를 들어안고 침상으로 가고 있었다.
"오라버니 .."
"조용히 해..짐은 더 참지 않겠다."
그가 조급히 그녀를 침상에 내려놓으며 성급히 속치마끈을 풀었다.
"오라버니..전 아직.."
그녀는 그를 받아들여야할지 거절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그의 손길을 밀어내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갑사와 능라의 속치마를 벗기고 있었다.
"그대도 궁에든지 이태이니 내마음을 모르지않겠지..
이제 그대도 열일곱이야.오랫동안 그대를 원해왔어.
그대도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짐은 그대에게서 아들을 원해.그대만이 짐의 후계자를 낳을 수 있다.이제 짐도 더이상 허수아비황제가 아니야."
그래도 그녀는 상기된 얼굴로 하나남은 명주속치마의 허리끈을 꽉 잡았다.
그가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도 어느새 용포를 벗어던지고 있다.
"아이같았던 그대를 궁에 불러들여 정말 아이키우듯 삼년을 보냈다.야단도 치고 달래기도하고...짐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는데...그대도..짐을 원치 않느냐?"그의 어조가 너무 간곡하여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낼 수가 없었다.
속치마셋이 연달아 흘러내리고 속적삼과 속바지가 벗겨졌다.그가 상아를 깎은 듯한 가냘프고도 눈부신 나신을 탐나듯 내려보더니 그의 날렵한 몸이 그녀의 갸날픈 몸위로 올라왔다. 그가 승마로 단련된 긴 다리로 그녀의 날씬한 다리를 열었다.처음은 아니지만 언제 그와 한몸이 되었는지 의식이 없었다.
여느때처럼 짜릿한 아픔 뒤에 뭔가 흐르는 듯한 느낌..
그녀의 단발마같은 비명뒤에 그의 해같이 웃는 얼굴이 꿈같이 해질녁 어두워져가는 허공을 떠돌았다.
그리고 뭐라 말할 수없이 부드러운 자신의 맨몸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
한참뒤 그의 어깨에서도 땀내가 났다.
"새벽인가요?밤인가요?"잠이 깬 그녀가 몽롱한 음성으로 물었다.
"이미 해가 떴다."
황홀한 황홀경속에 온몸이 반항할 기운도 없이 나른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그가 훤히 드러난 그녀의 맨어깨에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었다.그의 품안의 그녀의 익숙한 체취를 다시 느끼자 그의 정열이 또 달아올랐다.
그의 단단한 손가락이 그녀의 매끄러운 가슴의 굴곡과 유방의 능선을 흝고 지나갔다.
"피부가 꽃잎같아.아니 따뜻한 진주라고나할까..."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자신의 뜨거운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덮으며 새삼스럽게 그녀를 공략하자 그녀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를 힘겹게 받아들였다.
"황상
- 이전글 위로의 대상 23.04.12
- 다음글 막무가내 몰상식 승객 23.04.12